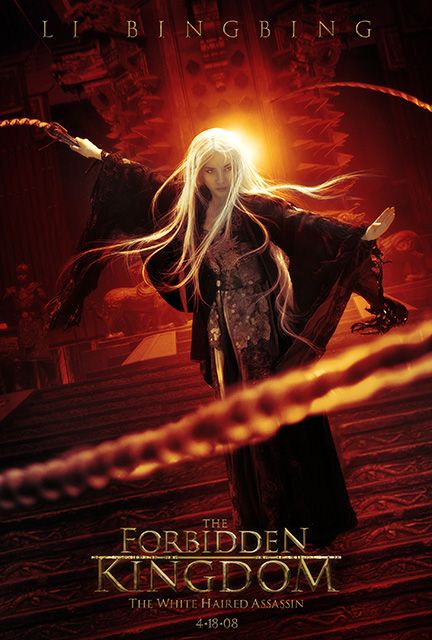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14734&f=B&t=853284 < 이 링크 또한 스포일러입니다.
지난 주에 마더를 봤습니다. 참으로 찜찜하고, 찝찝하고,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영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감상을 보고 저도 몇자 적었습니다. 찜찜하고, 찝찝하다고 해서 영화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영화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가쁜 호흡으로 풀어나가는 봉감독의 저력 역시 대단했습니다.
*** 경고합니다. 전부 스포일러입니다. 아직 영화를 안보신 분들 중 내용을 알기 싫으시다면 절대 보지 마세요. ***
진태가 두명의 고등학생 애들을 놀이공원에서 족칠 때, 그 중 한명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이야기를 하던 지겹다. 싫다... 아정의 대사들(의 기억)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집단적 모럴해저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 축이고, 어떤 분의 밀양 사건 연계에 생각치 못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였습니다. 영화 초기에 뺑소니 차를 쫒으며 도준이 '복수'라는 단어를 되뇌이던 것이 단순한 복선이 아니었습니다. 후반부에 도준은 자신이 다섯살때 엄마가 농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이번엔 침놔서 죽이게?' 라는 도준의 대사. 도준에게는 어린시절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강한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도준은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감옥 생활동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동팔이가 왜 죽은 애를 옥상에 올려놨을까. 아마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보이도록,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랬을거야' 라고 이야기 하던 식사장면에서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섯살의 기억이 상기되면서 상당히 정상적인 기억과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복수'라는 이미지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상충되다가 불타버린 고물상에서 주운 침통을 엄마에게 건내주면서 그 트라우마는 극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이야기.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다 큰 아들의 고추를 유심하게 보던 엄마. 그리고 자신이 힘들어 죽음을 각오했을 때 어린 아들까지 함께 가야 한다던 강박. 변호사와 만나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잠시 비췄던 박카스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환영. -평범하고 똘똘해 보였던 아이의 환영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도준은 태어날 때부터 바보였던 것이 아니라 농약을 먹고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마더의 모습은 못먹이고 못입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미안함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 상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자식에 대한 어긋난 사랑으로 표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존재, 심지어 어머니 자신과 동일시 하는 모습들이겠죠.
이건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마더였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도준이 아정을 죽이게 된 과정에 숱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남들에게 놀림받거나 맞을 때는, 한대 맞으면 두대 때리라는 엄마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유순하고 바보같던(아니 정말 바보였던) 도준에게 '바보'라는 트리거가 작동하면 강한 폭력성을 띄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교수들과의 씬도 그랬고, 유치장에서의 씬도 그랬고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아정은 비명에 갔지요. 물론 거기에 고의성은 없었고, 도준은 자신이 한 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더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맹목적인 사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결말이랄까요. 그 어긋남이 자식과 마더를 머더로 만들어 버리는 것...
사족이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봉준호 감독의 표현력이었습니다. 도준이 엄마와의 마지막 면회때 다섯살때의 기억을 이야기 하기 직전 다친 한쪽 눈을 가리고 사슴같은 눈망울을 보여주다가 그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맞아서 터진 다른 쪽 눈을 보여줬을 때, 소름 돋더군요. 이중적 자아 혹은 내면의 상처에 대한 굉장한 표현력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작두씬. 첫번째에서도 '저러다가 손가락....' 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 두번째의 씬 때 그 조마조마함은 몇배가 되더군요. 그리고 별일 없이 끝내는...관객을 갖고 놀 줄 아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장면. 옥상에 빨래처럼 널려있는 아정의 시신을 배경으로 세 명의 형사가 상반신만을 내놓고 나누는 대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골 땡겼던 장면은, 혜자가 도준의 사진을 보정하려 사진관에 들렀을 때, 농약의 종류를 말하면서 마음이 약해서 강한 농약을 못쓰고...했다는 그 장면. 이미 광기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덕분에 나중에 고물상 주인 죽일 때 그다지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족, 풀리지 않는 이야기. 사실 도준이 범인이다, 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 있을만큼 이야기를 풀어내고도 쓸데없는 의문이 남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그 시간에 왜 그 살인사건 장소에 있었을까요. 아정은 왜 그곳으로 들어갔을까요. 고물상 주인이 바닥에 펼쳐놓았던 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정의 별명은 쌀떡녀였죠. 그리고 고물상 주인 역시 아정의 핸드폰에 찍혀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도준이 현장검증을 하던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혜자가 도준이는 무죄라고 이야기 하자, 당장 제대로 신고를 해야겠다고 전화를 걸러갑니다. 고물상 주인의 이야기 시점에서의 도준은 아정만을 보고 쫒아갑니다. 그러나 도준은 유치장 안에서 고물상 주인과 눈이 마주친 일을 기억합니다. 과연 고물상 주인이 죽기 직전에 혜자에게 한 이야기는 다 진실이었을까요.아마도 제 찝찝함의 정체 중 많은 부분이 이 의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의문이 옳은 의문이라면 스릴러로서는 훌륭하지만 상당히 더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남자중에 혼자 사는 고물상 주인 같은 노인네인가. 라는...
하...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 영화는 너무 찝찝합니다. 전개가 어색하다거나 결말이 나빠서 느끼는 찝찝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알아왔는데도,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는 참 적응이 안됩니다. 이것이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이것은 이야기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권선징악류의 무협영화나 헐리웃 영화 같은 거나 봐야할까봐요...
네...그럼에도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짐을 지고, 다친 것은 엄마인 혜자가 아닌가 합니다. 죽은 사람보다 더한.
그래서 더더욱 찝찝한가 봅니다.
그리고 영화적으로 풀어내는 이 이야기의 교훈.
"아무에게나 바보새끼라고 하지 말자"